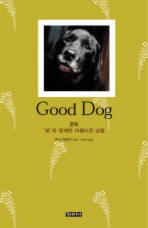 |
|
사람의 가족으로 살다 돌아간 반려견의 이야기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난 아침의 기분에 따라 몇 개의 향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 손목에 뿌린다. “칙~치잇” 양 손목을 비비고 귀 뒤 언저리에 톡톡 갖다 대면서 세상을 나설 준비를 마친다. 내 흥에 맞는 향수를 뿌리고 나면 난 검은 먹구름이 잔뜩낀 날 이거나, 후두둑 비가 오거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이 쏟아지는 맑은 날이거나 하늘만 아는 날씨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분좋았던 그날의 느낌을 온전히 기억하려 스스로 향수를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 기분은 내가 만든다. 밖을 나서기 전 내가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나름의 아로마 테라피Aromatherapy, 향기치료인 셈이다.
독립해서 혼자 지내다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느끼게 된 것은 ‘환대’였다.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를 외쳤을 때, 누군가 나의 귀환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 어떤 하루를 보냈던 무사히 돌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참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다. 독립의 장점이 자유롭고, 조용함이라면 본가와 결합한 장점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이다. 난 따뜻한 구속과 외로운 자유를 맞바꾼 것이다. 날 반겨주는 이들 중에서 현관문을 열면 탁탁탁 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꼬리를 치며 앉아있는 여섯 살난 시츄종 찌비는 단연 으뜸이다. 왕방울만한 촉촉한 눈으로 나와 시선을 맞추고 “어유~ 우리 찌비가 오빠를 기다렸어?”하고 얼루려고 하면 배를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해 배를 뒤집는다. 꼬리는 여전히 부채꼴로 흔들면서. 네 발 달린 이녀석은 내 가족이다.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면 바깥의 시름과 피로는 잠시 날아가 버린다. 이건 필경 애견 심리치료다.
난 반려동물의 의미를 수의사인 그녀가 어제 말해주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아니 정반대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반려동물의 ‘반려’를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 돌려받을 때 쓰는 ‘반려’와 같다고 보고 ‘유기견’의 다른 표현으로 알고 있었다. “바보야, 그건 애완견이라는 단어보다 더 격상해서 부르는 표현이야. 배우자를 동반자, 혹은 반려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반려동물이란 가족에 준하는 평생 나와 함께 할 동물을 말하는 거라고.” 그동안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측은지심’이 들었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여섯 살난 시츄종 ‘찌비’는 내 반려동물이자, 심리치료사다.
사랑스런 반려동물은 이 시대를 사는 도시인들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통한 애견 심리치료를 통해 사람과 미처 나누지 못한 교감을 동물과 나누려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생 아부를 떨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개는 외로운 도시민들의 좋은 친구이자 반려자가 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어울려 사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고통,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또한 고통이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괴로운 일이기에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그 얽매임이 없다.
사랑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사라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기에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법구경 16장- ‘쾌락의 장’ 중에서)
이쯤에서 독자들은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법구경을 운운하는가 의문이 들테다. 그렇다. 난 오늘,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떠나 보내는 슬픔이야 지극히 자연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가족과 같이 생각한 반려동물을 떠나 보냄은 처음 입양하면서 ‘식구로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슬픔’을 당하는 것이 싫어 반려동물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녀석이 없고 나면 그 허전함과 괴로움을 가족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역시 생체나이로 치면 나보다 더 늙었고, 앞으로 더 빨리 늙어버릴 녀석을 보면 그 걱정이 앞설 때가 요즘 들어 많아진다. 책 <굿독Good Dog - ‘보’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읽은 이유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칼럼니스트인 애너 퀸들런Anna Quindlen 의 반려동물이었던 ‘보’를 떠나보내는 이야기다. 원제목은 Good Dog Stay다.
이 책에는 ‘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성격이 어떻고, 얼마나 먹으며 어느 만큼 잘 노는지 말하지 않는다.‘아기를 키우는 엄마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듯 그런 기술들은 아이가 크고, 반려동물이 자라면서 펼치는 에피소드를 모두 제 3자적 입장에서 나름의 해석이 뭍어난 것이 아니던가? 그런 말로 한 권을 채우기란 무리가 있고 의미도 없다. 또 그것을 듣고 읽기는 고역스러운 일이다. 어차피 화자의 소설일 테니까. 저자는 가족들의 삶 속에 존재했던 ‘보’를 큰 숨으로 읽어야 할 한 편의 에세이형식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보’일 수 있고, ‘찌비’일 수 있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아무개일 수 있는 애견들의 사진을 중간마다 넣었다.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그 사진 때문에 더 재미있고, 가슴 아프게 슬픈 대목에서는 그 사진 때문에 더 슬퍼진다. 다양한 표정들, 모습들. 이 책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조연이었다.
퓰리처상 수상자답게 애너 퀸들런의 문체 역시 뛰어나다. 그녀가 말하는 가족의 이야기 속 한 켠에는 ‘보’가 함께 있었고, 보가 움직이는 행동반경엔 가족들의 사랑이 뭍어났다. 내 부모 내 형제를 떠나보냄이 ‘절망‘이라면, 반려동물을 보내는 마음은 ‘깊고 깊은 슬픔’처럼 느껴진다. 내 생애보다 앞서갈 것을 알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마음은 어쩌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녀는 ‘보’를 지켜보며 부모된 자신과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역할과 비슷하다.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있어주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 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없는 취급을 하다가 힘들 때나 무서울 때, 그리고 가끔은 행복할 때 찾는 주춧돌이자 배경이고 풍경이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개, 집은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떠났다가 다시 찾고 또 다시 떠날 수 있는 존재이다.” (30-31 쪽)
한숨을 내리 쉬던 어느 날,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니 ‘찌비’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한없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스런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다(그래,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짓말쟁이다). 그 눈에 위안을 얻는다. 쓰다듬는 녀석의 털에 따뜻함을 위로 받고, 어깨를 두드리는 대신 팔뚝을 핥아주면서(염분 흡수를 위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날 다독였다. 어떤 날은 단 둘이서 오랜 시간 동안 멍하니 쳐다본 적도 있고, 어느 날 밤은 녀석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있다. 가끔이지만 이럴 때는 ‘키운다’기 보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녀석도 살아온 시간만큼 지나면 떠날 것이다. 난 대충의 시간을 알지만, 녀석은 제 온몸에 있는 감각을 통해 밥을 먹어야 할 때와 ‘제 가족’이 와야 할 시간을 알고 문앞을 서성이고, 창문 밖을 바라본다. 지금 이 순간 난 녀석이 떠날 어렴풋한 미래의 시간을 걱정하지만, 녀석은 오늘 제 가족이 들어와야 할 시간을 알고 편하게 잠들어 있다. 해가 넘어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 앞에서, 창가에서 가족을 기다릴 것이다. 찌비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 아무생각 없이 사는 듯한 녀석은 오늘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내게 그것을 알려 주는 듯했다.
'리뷰모음 - Readingworks > 소설·비소설·인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꽃도시 - 오쿠다 히데오는 저리 가라! 올해 만난 가장 재미있는 소설. (0) | 2009.10.05 |
|---|---|
|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 스타 쉐프 박찬일의 이탈리아 요리 아나토미! (0) | 2009.09.21 |
| 100도씨 -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온도는 99℃다 ! (0) | 2009.06.10 |
| 오랜만에 만난 즐겁고 기분좋아지는 책! (0) | 2009.06.05 |
| 폴 오스터의 소설들, 혼자 쓴 것이 아니었다? (0) | 2009.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