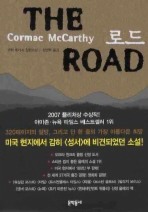 |
|
소설 <로드>속 주인공들,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
나는 책을 무척 좋아한다. 여기서 '무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뒤늦은 책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책은 한 권 마다 사람이요, 한 권 마다 이야기며, 한 권 마다 좋은 스승이라고 여겨진다. 최소한 서가書架에 꽂혀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 '나무들의 다른 모습'이어서 알지 못할 풍요로운 기분을 제공한다(풍요로운 기분만 느끼기엔 너무 비싸긴 하겠지만). 늦게나마 알게 되서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생을 사는 절반의 기쁨은 느끼지 못하고 죽을 뻔 했다. 일찌기 로마제국의 정치가 키케로는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책의 효용을 가장 잘 말해준 말 같은데 그의 말처럼 책은 음식이 되고, 오락이 되며, 지식이 되고, 위안이 된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오늘 제대로 만들어진 책다운 책 한 권을 만났다. 생긴 모양도 훌륭하고, 책을 쓴 사람도 훌륭하고, 책 내용 또한 훌륭한, '이게 바로 진짜 책이다'고 느껴진 책인데, 내용은 소설이다. 우선 책 자체를 살펴보면, 소설을 주로 펴내는 '문학동네'의 것이다. 갈색 재생지 표지에 타자기로 쓰여진 듯한 제목의 활자체가 잘 어울렸지만, 무엇보다 띠지가 훌륭하다. 암흑 속 여명때의 산을 보면 이럴까? 산 모양의 폭넓은 띠지는 스스로가 표지였다. 띠지를 벗기면 길 위에 선 남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 완벽한 설정이다.
작품 또한 훌륭한데 2007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37개국에 출간했으며, 곧 영화로도 소개될 예정인데, 일흔이 넘은(그래서 더 훌륭하게 여겨지는) 老소설가 코맥 매카시Coemac McCarthy의 <로드 THE ROAD> 이다. 저자는 누군가? 소설가 코맥 매카시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서부의 세익스피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책 모양 , 저자, 이야기. 이렇게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진 책을 자주 만나기가 좀처럼 힘든데, 그래서 그런 책을 만나면 무척이나 반갑다.
이 소설은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세상에 살아남은 부자父子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그린 이야기다. 희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남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울하고 암울한 소설이다. 암흑으로 둘러싸인 잿빛 세상에 남겨진 남자와 소년이 지도에 의지해서 '길'을 따라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간다. 그들이 길을 걷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걸으면서 겪는 일들은 생활이 된다. 소년은 주로 묻고 남자는 주로 답한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진 남자의 쉬운 대답은 무미건조하고 퍼석하지만 유일한 대화상대이고 사람다운 행동이기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겼고, 그래서 진실이 담긴 듯 느껴진다.
모두가 불타 버린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불타기 전 남겨진 것들을 찾아 입고 먹는 방법 뿐이다. 세상에 둘이라면 고독할 지언정 차라리 평화롭고 낫겠다. 알 수 없는 괴물에 쫓기고, 또 다른 살아남은 무리들을 경계하며 입고 먹어야 한다. 미래없는 내일, 갈수록 힘에 부치는 오늘나기. 낮에는 태양에, 밤에는 전등을 불빛 삼아 따끈한 커피를 보며 글을 접하는 내가 그들을 대하기가 머슥해진다. 저자의 실감나는 배경묘사는 그 세상속을 엿보듯 소름을 돋게 하고, 남자와 소년의 행색을 읽을 때는 머리와 등을 근질거리게 한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하는 생각이 여러 번이지만, 자살을 위한 권총 속에 든 두 개의 총알은 생존을 위한 저격용이 될 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끈질기다. 그래서 사람인지 모른다.
소설이 애초에 남자 혼자였다면 어떠 했을까? 그는 자살을 선택할까, 아니면 혼자이기에 더욱 끈질기게 살아남으려 애쓸까? 그에 대해 저자는 친철하게 혼자된 노인을 만나게 해 주어 답을 대신한다.
난 오랫동안 불을 보지 못했소. 그뿐이오. 나는 짐승처럼 살고 있소.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거요. 저 아이를 봤을 때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소.
천사인 줄 아셨나요?
뭔지는 몰랐소. 그냥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 아이가 신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그런 건 다 넘어섰소. 오래 있었거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신도 살 수가 없소. 당신도 알게 될 거요. 혼자인 게 낫소.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오. 마지막 신과 함께 길을 떠돈다는 건 끔찍한 일일 테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요. 모두가 사라지면 좀 나아지겠지.
사람이 혼자라면 사람이 아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기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지도 모른다. 그런 혼자 남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신도 살 수 없다니...신이 보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일테다. 책이 말하는 대로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가 났다. 내 눈에 펼쳐진 어두운 세상이 싫어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적도 있었다. 모두 읽고 난 다음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떠올르지 않겠다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책을 덮고 느낀 한 마디다.
하지만 이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찾아 들어오는 퇴근길 지하도에 '그들'이 있었다. 등짝만한 배낭 두어 개와 두꺼운 골판지 몇 장, 올이 보이지 않는 담요를 들고 차가운 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새카만 사람들, 노숙자였다. 그 속에 남자도 보이고, 소년도 보였다. 한 쪽 구석엔 홀로 된 노인도 있었다. 그들은 오늘을 살게 하는 한 끼의 무료식사를 위해 한 시간여 줄을 서며 낮을 보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 단지 모르고 지냈을 뿐, 아니 모른 척 했을 뿐 내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코맥 매카시의 <로드>에서는 자연이 사람을 버렸지만, 내가 본 지하도에 있는 그들은 사람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남자와 소년,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재天災이기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은 인재人災 다. 우린 오늘도 사람을 버리고 있다. 사람에게 버려진 그들에게 신은 존재할까? 신도 그들을 버렸을까? 캐시미어 스웨터에 양모 코트를 입고 서 있던 난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가져야 했던 걸까? 아님 패배자의 모습은 저 꼴일테다 각성하며 자리를 피해야 할까? 알 수 없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 희망을 안고 오늘을 보내고 있는 나도, 실은 우리는 소설 <로드> 속의 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길을 걷다 넘어져 일어설 수 없다면 지하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혼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기에 애써 쉬지 않고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둡고, 암울해서 읽기 거북하기까지 한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리뷰모음 - Readingworks > 소설·비소설·인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처지가 달라 동조하기 힘든 호모오피스쿠스들의 이야기 (0) | 2009.02.23 |
|---|---|
| 소설가 성석제가 내놓은 인간풍경 가득한 소설들의 잔치상 (0) | 2009.02.22 |
| 파울로 코엘료와 대화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0) | 2009.02.09 |
|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우리들의 청춘예찬 (0) | 2009.02.07 |
| 사랑은 에로틱한 사람도 로맨틱하게 만든다? (0) | 2009.02.03 |








